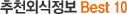고려시대에는 제례에 국수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음식디미방(1670)에는 면(메밀국수), 시면(녹말국수), 토장(녹두나화), 착면, 별착면, 차면, 난면 등 다양한 면 음식들이 등장한다.
조미숙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국수를 먹었던 민족으로 특히 면 음식은 남한 사람들이 더 즐겨먹었다”고 말한다. 팔도의 다양한 면 음식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기록을 위해 조 교수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대학원 학생들이 나섰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방앗간 국수’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충남 예산읍 예산리 쌍송국수(041-335-7533) 공장이다. 말이 공장이지 방앗간과 다를바 없다.
1952년 지었다는 이 흙벽집은 당시 예산에서 단 2채 밖에 없었다는 2층집.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빈티지 여행코스’로도 제격이다. 1층의 반죽기와 국수틀을 거친 면발은 2층 토방에 마련된 거치대에 널려 햇볕과 바람을 적당히 쬐며 건조된다.
“국수는 말리는 것이 젤 중요혀유. 햇볕에 잠깐 내놨다가 응달에서 하루 정도 재놓고, 이튿날에는 2층으로 올려 다시 말리지유. 근디 그날 날씨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수 뽑는 기술을 배웠다는 김성산(60) 사장의 말이다.
쌍송국수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평양에서 시집 온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운영해오던 오래된 가내수공업 국수 공장이다. 지금도 국수를 반죽하고 뽑는 기술, 만드는 기술 모두 전세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취재를 내려온 20대 중반의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기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 2층에 널려 있는 네자 길이의 국수 면발 앞에서 기념 촬영하기 바쁘다.
박아름 양은 “아직까지 손으로 면발을 뽑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기회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산 씨는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찾아와 국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 귀찮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국수공장에 들러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국수 뽑는 역사를 둘러볼 수 있으며, 맛있는 수제 국수도 사갈 수 있다.
1급수를 자랑하는 금강 상류의 충북 청산면 지전리 (선광집043-732-8404)를 찾아가면 50~60년대 이후 ‘왜 국수가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이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다. 62년부터 민물고기를 푹 고아낸 국물로 생선국수를 내고 있는 서금화(81) 할머니의 설명이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 특히 50~60년대에는 더했지. 근데 금강 상류에는 물고기는 많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강가에 나가서 붕어·메기·잉어, 여름에는 빠가사리 이런 것 잡아서 끊여먹은 거야. 매운탕을 술안주로 먹은 다음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삶은 거야. 그때는 천렵국이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의 생선국수 또 어탕국수로 불리게 된 거지.”
팔순이 넘은 서 할머니는 “전쟁 나고 쌀은 없지만, 밀가루는 있었거든. 당시에는 이 근동에도 밀 농사를 하는 집이 많아 방앗간에 찧어서 그대로 국수를 냈었지”라며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당시를 회고했다.
그렇다. 콧등치기국수(메밀), 감자국수(감자), 올챙이국수(옥수수) 등 각 지방의 개성 있는 면 음식은 쌀이 없어 대용으로 먹을 수 밖에 없었던 ‘아픈 추억’의 흔적이다. 지금에 와서는 ‘참살이’ 바람을 타고 별식, 별미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전통식생활문화연구원 김영복 원장은 “진주는 평양과 더불어 기생문화가 꽃을 피웠던 곳”이라며, 그래서 “진주냉면에는 진주 기생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다”고 한다. 평양냉면과 더불어 조선의 2대 냉면으로 치던 진주냉면은 경술국치 이후 진주관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작거리로 나와 지금의 중앙동시장에 가게를 내면서 대중화됐다.
관기들 또한 관아에서 나와 고급 요정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의 진주기생을 10여년 전 직접 만나봤다는 김 원장은 “의령에서 만난 기생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당시 한양에서 내려온 한량들이 요정에서 술을 한 잔 한 뒤, 기생들을 데리고 2차를 먹던 곳이 냉면집”이라고 전한다.
진주냉면은 메밀과 감자전분을 7:3으로 섞은 면에 해물로 국수를 우려내고, 값비싼 해물과 녹두전 등을 고명으로 얹는 것이 특색이다. 지금은 서부시장에 자리한 진주냉면(055-741-0525)에서 약소화된 진주냉면을 재연해 내놓는다. 2박3일 동안 달이듯 우려낸 해물 육수가 진한 맛을 낸다.
벌교 5일장에 방문하면 손으로 반죽한 밀가루를 칼로 썰고 삶고 끓여내는,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온 칼국수의 오랜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
4일과 9일, 벌교장이 서는 날이면 김귀례(68) 할머니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손수레에 물통과 밀가루 포대, 삶은 팥을 싣고 시장 안쪽 전봇대가 있는 담벼락 밑에 가게를 차린다. 커다란 솥 2개를 걸어 불을 지피고, 대여섯 명이 쪼그려 앉을 수 있는 간이테이블을 놓아 겨우 음식점 모양새를 차린 뒤 팥칼국수를 만들기 위한 반죽에 들어간다. 직접 밀고, 썰어, 끓여내는 팥칼국수는 말 그대로 별미다.
특히 입에 착 달라붙는 달짝지근한 팥국물 맛이 일품이다. 모든 조리 과정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미료도 가미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강호동의 ‘1박2일’에 등장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 그릇에 3000원. 노상에서 장이 설 때마다 여는 집이기 때문에 연락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