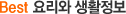| ||||||||
|
||||||||
|
Home > 요리 > 테마요리 > 요리와 생활정보 |
|
||||||||||||||||||||||||||||||||||||||||||||||||||||||||||||
|
|
   |
뚜껑 열리면, 난 네가 당겨 | ||
|
||
http://cook.startools.co.kr/view.php?category=TUAYJQ%3D%3D&num=FB1KdQ%3D%3D&page=8

|
||
| 얼큰하게 맵군, 지독하게 달군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맛이 당기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입 안에 뭔가를 넣어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네 인생사. 하지만 가만 관찰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후 사람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부장님의 호출을 받은 뒤, 자리에 오면 여지없이 서랍 속 초콜릿을 꺼내 먹는다는 박 모 양, 회사 일로 울화가 치밀 땐 무교동에가서 꼭 낙지볶음을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김 대리의 사례뿐이 아니다. 라면이나 짭짤한 과자, 튀김과 같은 고칼로리 음식, 여러 종류의 빵을 무한대로 섭취하며 사람들은 각자 입맛 당기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 몸이 특정한 음식이나 맛을 원할 경우 이것은 나트륨, 칼슘과 같은 체내의 무기질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난히 당기는 음식이 있다면 그 맛을 통해 일정한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송재철 교수는 사람마다 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선호하는 맛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람의 혀에는 맛을 감지하는 접수체가 있는데 단맛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개개인에 따라 짠맛, 매운맛 등 일정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대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미감은 단맛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땐 각자의 혀 접수체가 더 잘 감지해 강한 자각을 느낄 수 있는 맛을 선호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맛의 감별과 자극은 자주 섭취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기 마련.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찾게 되는 ‘맛’은 엄연히 말해 감각이 아닌 음식 자체에 대한 욕망인 식욕이므로 무절제한 섭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
   |
| 총 게시글 2,515개 |
 | 명란파스타 | 조회: 9462 |
| 명란파스타누구나 좋아하고 꾸준하게 사랑받는 일식 스타일의 트렌디 파스타로 몇 가지만 주의하면 해산물을 손질하는 번거로움 없이 풍부한 바다의 맛과 향을 전해주는 훌륭한 파스타가... | ||
| [ 까꿍 | 2014-05-06 ] | ||
 | 고등어파스타 | 조회: 9074 |
| 고등어파스타이탈리아의 정어리 파스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친근한 고등어로 바뀌어 재탄생했다. 고등어를 통으로 놓으면 메인 정찬 같은 느낌이 나며, 한입 크기로 부스러트려 놓... | ||
| [ 햇살 | 2014-05-06 ] | ||
 | 레드커리파스타 | 조회: 8805 |
| 레드커리파스타인도 요리에 사용하는 향신료로 만든 퓨전 파스타로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난다. 홀토마토와 빨간 파프리카가 어우러진 은은한 색상이 파티 테이블에 잘 어울리며 홍고추... | ||
| [ 윈디 | 2014-05-06 ] | ||
 | 굴크림파스타 | 조회: 8782 |
| 굴크림파스타겨울이 제철인 굴은 특별한 날 상차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식재료. 신선한 최상급의 굴은 부드러운 크림소스에 매칭하면 한층 고급스러운 파스타를 완성할 수 있다. ... | ||
| [ 어린새싹 | 2014-05-06 ] | ||
 | 청양고추알리오올리오파스타 | 조회: 9427 |
| 청양고추알리오올리오파스타전통 이탈리아 파스타의 기본인 알리오올리오파스타에 한국의 청양고추를 넣어 매콤하게 만든 파스타. 오일 파스타를 선호하고 한국 식재료를 믹스하는 최근 파... | ||
| [ 애니랜드 | 2014-05-06 ] | ||
 | 아롱사태볼로네제파스타 | 조회: 9572 |
| 아롱사태볼로네제파스타볼로네제 소스에 아롱사태를 넣어 만든 파스타로 걸쭉하고 중후한 맛이 난다. 리가토니 면과 비슷한 크기로 자른 아롱사태가 파스타를 더욱 푸짐하게 만들며 입안... | ||
| [ 가시 | 2014-05-06 ] |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
 |